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5일 약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대한민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 사법부가 출범한 것은 광복 후 3년이 지난 1948년의 일이다. 이듬해인 1949년 8월15일에는 대법원 산하에 법원행정처가 신설됐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그에 따른 사법부 독립을 실현하려면 재판의 독립은 물론 사법행정의 독립도 필요하다는 이론에 따른 조치였다. 법원의 인사·예산·시설관리·홍보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행정부 소속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산하에 법원행정처를 두고 그 조력을 받아 사법행정을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중에서 지명하는 인사가 겸임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5일 약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대한민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 사법부가 출범한 것은 광복 후 3년이 지난 1948년의 일이다. 이듬해인 1949년 8월15일에는 대법원 산하에 법원행정처가 신설됐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그에 따른 사법부 독립을 실현하려면 재판의 독립은 물론 사법행정의 독립도 필요하다는 이론에 따른 조치였다. 법원의 인사·예산·시설관리·홍보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행정부 소속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산하에 법원행정처를 두고 그 조력을 받아 사법행정을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중에서 지명하는 인사가 겸임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된 박영재 대법관이 13일 오후 퇴근하며 취재진을 의식한 듯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박 대법관은 16일부터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시작했다. 뉴시스 법원행정처 차장은 차기 대법관 ‘0순위’로 통하는 요직이다. 어디 그뿐인가. 법원행정처에서 실·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엘리트 판사’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사법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관들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이가 사법행정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법원 바깥의 진보 정당은 물론 개혁 성향 판사들 사이에는 ‘법관의 관료화를 부추겨 판결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행정처가 ‘출세 지향적 판사들의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을 전담할 새 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존재한다.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된 박영재 대법관이 13일 오후 퇴근하며 취재진을 의식한 듯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박 대법관은 16일부터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시작했다. 뉴시스 법원행정처 차장은 차기 대법관 ‘0순위’로 통하는 요직이다. 어디 그뿐인가. 법원행정처에서 실·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엘리트 판사’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사법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관들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이가 사법행정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법원 바깥의 진보 정당은 물론 개혁 성향 판사들 사이에는 ‘법관의 관료화를 부추겨 판결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행정처가 ‘출세 지향적 판사들의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을 전담할 새 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존재한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의 독립을 위해선 지금의 법원행정처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마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5일 약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방침 등을 염두에 둔 듯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 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여당을 향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 법원행정처장은 2024년 8월 취임한 박영재 대법관이 맡을 예정이다. 여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역사상 마지막 처장이 될 수도 있다. ‘사법부 독립에는 사법행정 독립도 포함된다’는 당연한 명제마저 무시되는 요즘 한국의 현실이 낯설다 못해 두렵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포토] 폭설에 밤 늦게까지 도로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000920610800.jpg)

![[포토] 국회 예결위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0410898931_1762479667.jpg)
![[포토]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앞두고 팝업스토어 오픈](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4160199219_1762492560.jpg)
![[포토] 예지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화보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82431778689.jpg)

![[포토]두산 안재석, 관중석 들썩이게 한 끝내기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1a1c4d0be7434f6b80434dced03368c0_P1.jpg)

![[작아진 호랑이③] 9위 추락 시 KBO 최초…승리의 여신 떠난 자리, KIA를 덮친 '우승 징크스'](http://www.sportsworldi.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8238.jpg)
![블랙핑크 제니, 최강매력!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ed1b2684d2d64e359332640e38dac841_P1.jpg)
![[포토]첫 타석부터 안타 치는 LG 문성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2/news-p.v1.20250902.8962276ed11c468c90062ee85072fa38_P1.jpg)
![[포토] 아홉 '신나는 컴백 무대'](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514134.jpg)
![블랙핑크 제니, 매력이 넘쳐!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c5a971a36b494f9fb24aea8cccf6816f_P1.jpg)
![[포토]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9369.jpg)
![[포토] 김고은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236.jpg)

![[포토] 박지현 '순백의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414.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하늘 '완벽한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457.jpg)
![[포토] 발표하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206916880.jpg)
![[포토] '삼양1963 런칭 쇼케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008977281.jpg)
![[포토] 언론 현업단체, "시민피해구제 확대 찬성, 권력감시 약화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23135571578.jpg)
![[포토]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 리뉴얼 오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42544910604.jpg)
![[포토]끝내기 안타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산 안재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0df70b9fa54d4610990f1b34c08c6a63_P1.jpg)
![[포토] 아이들 소연 '매력적인 눈빛'](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08492.jpg)

![[포토] 김고은 '상연 생각에 눈물이 흘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613.jpg)
![[포토]두산 안재석, 연장 승부를 끝내는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b12bc405ed464d9db2c3d324c2491a1d_P1.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쥴리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35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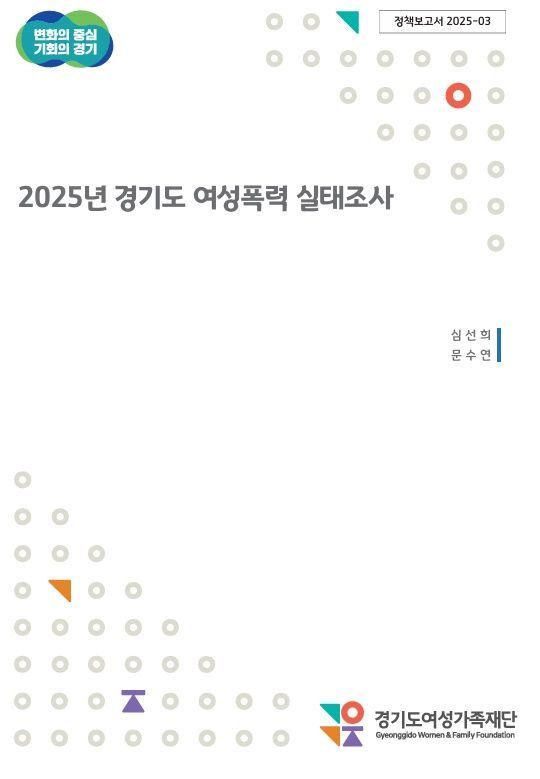
![[SNS에 빠진 청소년]②"좋아요" 누르니 성범죄·도박·마약에 노출…호기심은 범죄로 연결](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6011507550791848_1768431307.png)
![[SNS에 빠진 청소년]①"엄마가 팔로우해서 부계정 팠다"...스마트폰 뺏자 뛰쳐나간 중학생 딸](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6011409094690353_176834938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