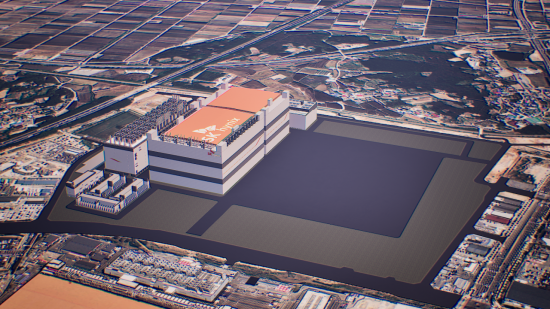새해가 되면서, 세계 첨단산업 경쟁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 빗발쳤던 기술유출 사고를 돌아보며 새로운 방지책 마련을 고심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술유출이 두드러졌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연초부터 적극적인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사내에 조성해 둔 기존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새로 추가할 만한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도입돼 기업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카메라 감지 센서'는 그 기능과 역할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센서는 공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의 작동 여부를 감지하는 첨단 장비다. 가령, 기술을 유출하고자 공장에 진입한 직원이 몰래 숨긴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할 경우, 센서는 카메라 셔터가 주기적으로 '찰칵'하는 반응, 횟수를 읽고 이것이 이상 신호인지를 판별한다. 카메라를 어디에 숨겨도 센서는 이를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안 관련 부서 직원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띄워 기술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촬영인지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이를 비롯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방도를 통해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회사 방문객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다. 중요 생산시설을 찾은 인사들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에 대해선 카메라 등을 모두 스티커로 가리고, 필요한 경우 내용물을 포맷해서 나가도록 조치했다. 사전에 예약하지 않은 방문객들에 대해선 출입을 불허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 기술유출이 주로 사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해, 퇴사자들에 대해선 "동종업계 기업으론 이직하지 않는다"는 서약도 받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 이직을 막을 실질적인 방어막 구실은 못 하고 있다. 이직 후 소송의 발판이 되는 '사후 구제' 조치로밖에 이용되지 않는다. 이직과 함께 유출된 기술은 도로 담을 수 없다.
기업들의 갖은 노력에도 기술유출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응 기술이 고도화되는 만큼 유출의 수법 역시 수준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기상천외'한 수준이란 평가도 나올 정도다. 지난해 12월23일 검찰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등 10명의 사건은 업계와 법조계의 혀를 내두르게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인 A씨 등 5명,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등 5명이 공모해 중국으로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이었던 10나노급(㎚, 1㎚=1억분의 1m) D램 공정 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이른바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해 수사망을 피해 다녔고, 일당 중 일부가 출국금지 또는 체포를 당하면 전용 메신저로 '하트' 네 개(♥♥♥♥)'를 보내 위험한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B씨는 CXMT로 이적하면서 공정종합절차서(PRP)에 입력된 D램 공정 600개를 모두 노트 12장에 직접 손으로 써서 갖고 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업들로선 자력으로 기술유출을 막기엔 한계가 있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간첩법에 존재하는 흠결을 되짚어보고, 관련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OX 테스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포토] 폭설에 밤 늦게까지 도로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000920610800.jpg)

![[포토] 국회 예결위 참석하는 김민석 총리](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0410898931_1762479667.jpg)

![[포토]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앞두고 팝업스토어 오픈](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10714160199219_1762492560.jpg)
![[포토] 예지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 화보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9/20251009182431778689.jpg)

![[포토]두산 안재석, 관중석 들썩이게 한 끝내기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1a1c4d0be7434f6b80434dced03368c0_P1.jpg)
![[작아진 호랑이③] 9위 추락 시 KBO 최초…승리의 여신 떠난 자리, KIA를 덮친 '우승 징크스'](http://www.sportsworldi.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518238.jpg)
![블랙핑크 제니, 최강매력!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ed1b2684d2d64e359332640e38dac841_P1.jpg)
![[포토]첫 타석부터 안타 치는 LG 문성주](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2/news-p.v1.20250902.8962276ed11c468c90062ee85072fa38_P1.jpg)
![[포토] 아홉 '신나는 컴백 무대'](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514134.jpg)
![블랙핑크 제니, 매력이 넘쳐! [포토]](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9/05/news-p.v1.20250905.c5a971a36b494f9fb24aea8cccf6816f_P1.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하늘 '완벽한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457.jpg)

![[포토] 박지현 '순백의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414.jpg)
![[포토]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519369.jpg)
![[포토] 김고은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236.jpg)
![[포토] 발표하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206916880.jpg)
![[포토] 언론 현업단체, "시민피해구제 확대 찬성, 권력감시 약화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23135571578.jpg)
![[포토] '삼양1963 런칭 쇼케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4008977281.jpg)
![[포토] 김고은 '상연 생각에 눈물이 흘러'](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7613.jpg)
![[포토]끝내기 안타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산 안재석](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0df70b9fa54d4610990f1b34c08c6a63_P1.jpg)
![[포토] 한샘, '플래그십 부산센텀' 리뉴얼 오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42544910604.jpg)
![[포토] 아이들 소연 '매력적인 눈빛'](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08492.jpg)

![[포토]두산 안재석, 연장 승부를 끝내는 2루타](https://file.sportsseoul.com/news/cms/2025/08/28/news-p.v1.20250828.b12bc405ed464d9db2c3d324c2491a1d_P1.jpg)
![[포토] 키스오브라이프 쥴리 '단발 여신'](http://www.segye.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504358.jpg)




![[K반도체의 미래]②딥엑스, 현대차·삼성 협업…"로봇 칩 이어 2나노 칩 개발"](https://cphoto.asiae.co.kr/listimg_link.php?idx=2&no=2025120313035441647_1764734634.jpg)